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연차 유급휴가 발생
1년 미만 근로자는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연차 발생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 지급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손꼽아 기다리는 연차 유급휴가. 하지만 정작 자신의 연차가 언제, 몇 개나 발생하는지,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된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이자, 재충전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법으로 보장된 제도다. 2025년 기준, 복잡하고 헷갈리는 연차 발생 기준과 미사용 연차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연차수당 계산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했다.
연차 유급휴가는 법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생도 해당 요건만 충족하면 동등하게 연차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로 정할 수는 있다.

연차 발생 개수는 근속 기간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뉜다. 우선,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동안 결근 없이 성실히 근무(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이런 방식으로 입사 후 1년간 최대 1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다.
이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받게 된다. 1년 차에 발생한 최대 11개의 연차와는 별개로, 1년 근속 시점에 15일의 연차가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다.
근속 연차가 쌓이면 연차일수도 늘어난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기본 연차에 더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3년차 직장인은 16일(기본 15일 + 가산 1일), 5년차는 17일, 7년차는 18일의 연차를 받게 된다. 이러한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일수는 최대 25일을 넘을 수 없다.

연차일수를 계산하는 기준일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원칙은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5년 5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식이다. 하지만 많은 회사가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전 직원의 연차를 매년 1월 1일에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한다.
이 경우,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5년 1월 1일에 전년도 근무 기간(184일)에 비례하여 ’15일 × (184일/365일)’로 계산된 약 7.5일의 연차를 선부여받게 된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되므로,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만약 주어진 연차를 1년 동안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연차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된다.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주 40시간 근무 시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이 포함되지만,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된다.

단,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이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요구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회사의 적극적인 사용 권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휴가를 가지 않았다면, 회사는 이를 금전으로 보상할 책임이 없어진다는 의미다. 따라서 연차는 가급적 소멸 시효(1년)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막거나,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연차 신청을 거부당한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연차는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본인의 연차 발생 기준과 수당 지급 요건을 정확히 알고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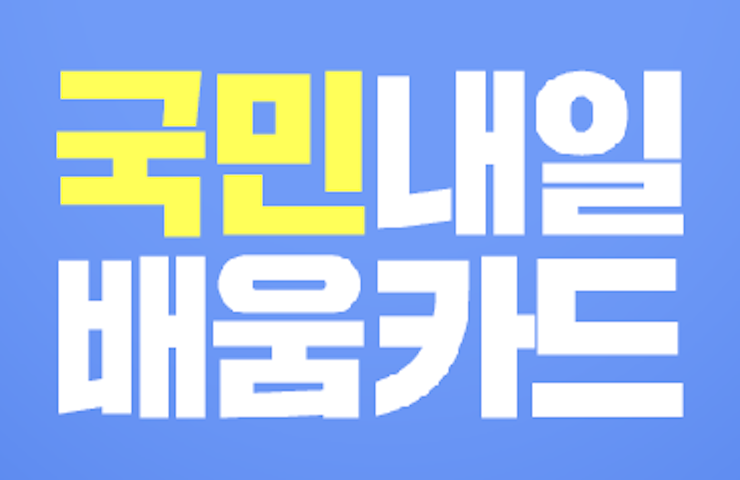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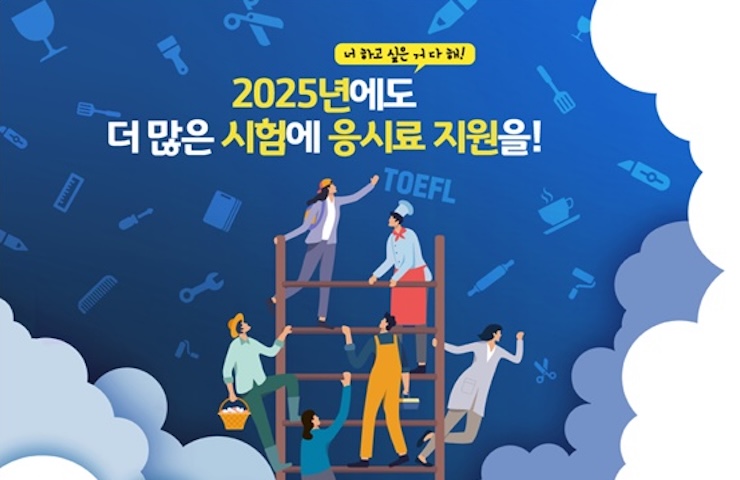











댓글 쓰기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해야합니다.